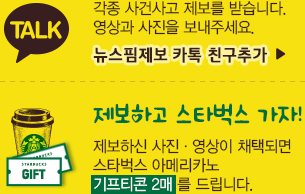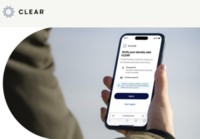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중이 새 버전의 '갈등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미국이 이른바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중국 해운업체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세' 부과로 맞섰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관세와 항만 수수료 조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둘러싼 배경은 첨예하다. 산업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충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내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직접 제재한 것은 한국이 그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제재를 받은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들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마스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상징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이번 제재는 한국의 통상외교 방향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된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중국의 불편한 속내 말이다.
'이번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배경이 된다. 조선 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전략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소재, 부품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희토류, 리튬, 니켈 등 첨단산업의 바탕이 되는 핵심 광물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일부는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선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관세협상 결과가 향후 우리 산업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 당시 현대차·기아는 결과적으로 생산기지를 헐값에 넘겨야 했다. 이번 한화오션 제재 사태는 '제2의 사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에 둔 통상 전략' 명확히 세우는 것에 있다. 특정 진영에 기댄 전통적 외교 방식에서는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제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독립적이고 일관된 외교·통상 노선을 세우는 것이다. '누구 편에 서느냐'보다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