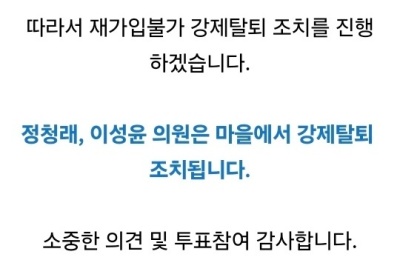입소 후 건강 악화..."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
시설 입소 장애인 약 80%는 발달장애인
[편집자]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깨끗한 시설에 친절한 사회복지사나 의사들이 사랑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을 하루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시설 내에서의 통제된 집단생활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지요. 뉴스핌은 '탈(脫)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이 왜 시설을 감옥으로 여기는지,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 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임현주(58) 씨는 1991년 첫째 아들 서모 씨를 낳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아이였지만, 세 돌이 지나도록 왜인지 성장이 느렸다.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은 결과 아이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 임씨의 나이 31살 때였다.
아들 서씨의 인지능력은 3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지는 않을까, 바닥에서 더러운 것을 주워 먹지는 않을까, 임씨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아들 옆에 붙어 있어야 했다. 임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과연 모성애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고 했다.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된 임씨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낸 뒤 일을 하고, 퇴근하면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매일 밤잠도 설쳤다. 아이가 혹여 대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임씨는 아이를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임씨는 "일방적인 나의 결정이었다"며 울먹였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들을 떼어 놓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 아들, 시설 입소하자 건강 악화..."둘 다 살려고 시설 나왔다"
2010년 서씨가 대전 소재 모 시설에 입소하자 임씨 생활은 한결 나아졌다. 임씨는 "매일을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서씨에게는 고통이 시작됐다. 흡인성 폐렴에 걸리고, 변비가 심해져 관장을 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시설에 면회 온 엄마를 만나고 난 뒤면 일주일 내내 소리를 지르고 턱을 치는 등 행동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과잉행동이 심해지자 시설은 서씨에게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서씨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다. 약 기운으로 눈이 풀려 있는 아들을 마주하게 된 임씨는 '나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임씨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임씨는 "아이를 시설에 넣을 때는 나를 위주로 생각했는데, 나도 살고 아들도 사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생각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 부족한 복지서비스에…발달장애인들 시설로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만9662명 중 지적·자폐 장애인은 2만3635명이다. 시설 입소자 중 약 79%가 발달장애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해 발달장애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시설에 내몰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씨 사례처럼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돌보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거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크게 '교육 및 재활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나뉜다. 복지서비스는 다시 ▲집합적 서비스 ▲1대 1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핵심은 1대 1 지원 서비스 중 하나인 '활동지원 서비스'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세면 등 기본적인 신변처리를 비롯해 청소 등 가사활동, 외출 동행 등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적게는 월 45시간, 많게는 월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평균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은 120시간으로 하루 4시간 수준이다.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총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발달장애인 지원 책임이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소한의 복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성인기 발달장애인 17만명 중 어떤 복지기관도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4만50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탈시설 불안한데…"아이 관점에서 무엇이 행복한지 생각해야"
어쩔 수 없이 발달장애인을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설을 없애자는 탈시설 운동은 일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다. 무작정 시설을 없앨 경우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봐야 할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들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일부가 문을 닫으면서 지원이 끊기자 부모들의 고충은 가중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5%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공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본 임씨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장애인 아이의 부모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원주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굉장히 불안했다"며 "부모들에게 시설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씨는 "아이가 시설에서 나와 자신의 욕구와 취향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며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