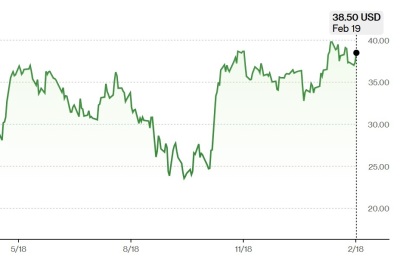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서울=뉴스핌] 김양섭 산업부장 =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완성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와 함께 운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율주행이 여전히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
자율주행은 더 이상 연구실이나 시범 구간의 기술이 아니다. 일반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머지않아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기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5년쯤 뒤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이 과연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변화는 특정 기업의 전략에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영역에 어떤 형태로든 진입해 있다. 플랫폼 기업은 이동 서비스를 장악하려 하고, 반도체 기업은 자율주행의 연산 두뇌를 공급하며, 완성차 업체들은 하드웨어 중심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이제 하나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장이 됐다.
이 흐름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로봇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반도체와 AI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도로 위 이동 수단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자율주행이 더 이상 완성차 업체만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현실의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민을 태우고 도심을 달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바이두 등 기업들이 수천 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시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은 기술 가능성에서 운영 규모와 사업성으로 이동했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변화 앞에서 떠올릴 기억이 있다.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를 이유로 논쟁은 길어졌고 혁신은 멈췄다. 이른바 '타다 사태'가 상징적이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글로벌 경쟁은 계속 진행됐고, 차량 공유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에서 한국은 뒤처지게 됐다.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은 우버의 후발주자인 그랩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도와 규범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완전 무인'이 아니어도 된다.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단계적 자율주행, 특정 조건과 환경부터 적용하는 방식 등 선택지는 다양하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기술이라는 이유로 도입과 활용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산업 경쟁에서 기술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쇄국은 대개 많은 기회를 잃은 뒤에야 그 대가를 깨닫게 했다. 역사는 이를 수차례 증명해왔다.
정치권에서도 뒤늦은 반성이 나온다. 과거 '타다 금지법'에 찬성했던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형 우버'와 자율주행 택시를 언급한다. 혁신을 막았던 판단이 도시 경쟁력을 훼손했다는 자인이다. 늦었지만 반성하고 이제라도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기술의 완성도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 사회가 변화의 방향을 읽고, 이를 제도와 산업 구조 안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가는 흐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