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문학상·노작문학상 수상,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동균 시집 '한밤의 이마에 얹히는 손'(문학동네)은 영혼(靈魂)과 육신(肉身)의 경계 쯤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노래한다. 시인은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서늘하거나 서정적인 언어로 천지간의 긴장에 대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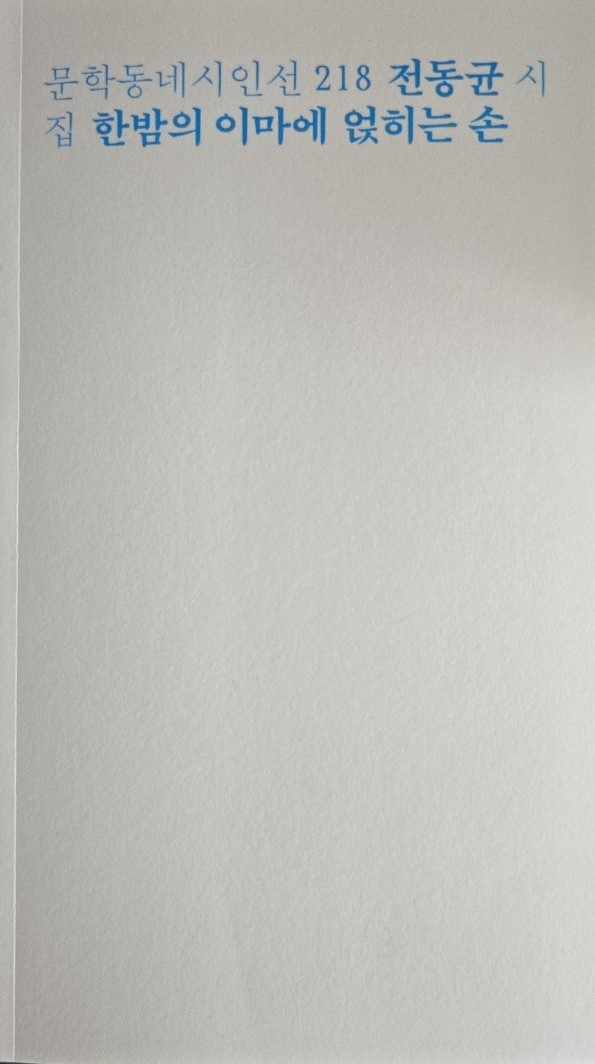
'한밤의 이마에 얹히는 손,/ 촛불 같고 서리 같은 그 손이 누구 것인지/ 더이상 묻지 말자// 기도하지도 말자, 더 외로워질 뿐이니// 잊고 잊히는 일은 유정한 일이어서/ 나는 날마다/ 사라지는 별의 꼬리에 매달려 춤추는 꿈을 꾸고/ 아침마다 낯선 곳에 와 있고' -'아침마다 낯선 곳에' 부분.
시인의 언어는 투명하면서도 때로는 날카롭다. 행간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에 찔릴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시집을 읽어나가야 한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한밤의 이마에 얹히는 손'은 지극히 인간적인 손길, 가령 어머니의 그것 같은. 또 한편에서는 신의 숨결을 언뜻 느끼기도 하는 손길이다. 그의 시는 표면적으로는 한없이 차분하지만 한편으로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다.
시인은 '자꾸 늘어나는 알약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가며 '폐기종을 앓아도 담배를 끊지 않는''불학무식'(숟가락별)의 아픈 몸으로 어디론가 향한다. '내 입속엔 얼어붙은 눈' 같은 약을 머금고 '바람 속을, 한밤 같은 햇빛 속을/ 수많은 그림자들을 품고 버리며'(내 피에는 약냄새가 나고) 기어코 가 닿고자 하는 시인의 경지(境地)는 과연 어디일까? 시인은 혼돈이고 진흙탕인 삶에서 생각과 느낌이 육화된 시, 그래서 할 말만 하는 명징한 시를 꿈꾼다. 그것은 곧 그가 꿈꾸는 삶이자 가 닿고자 하는 그 어디다.
'말을 아끼려 해요// 말과 말 사이에 그늘이 펼쳐지면/ 나를 바라보는 당신이 보여요/ …/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당신 것도 아니죠// 우리는/ 밥과 사랑과 시간의 하인/ 하룻밤 새 모든 꽃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바람의 하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고는/ 밥을 구할 수 없고/ 잠을 청할 수 없으니…' -'안과 바깥' 부분.

전동균의 시는 짐짓 탁월한 종교시편처럼 읽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밥과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의 시편으로 읽히기도 한다. 문학동네시인선 218번으로 그의 여섯 번째 시집이다. 전동균 시인은 1986년 '소설문학' 신인상 시 부문을 통해 등단, 올해로 시력 40년에 육박한다. 백석문학상, 노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는 '함허동천에 서성이다''거룩한 허기'등이 있다. oks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