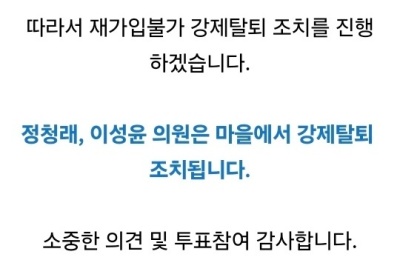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후임을 둘러싸고 우리은행 안팎이 소란스럽다. 이 행장의 사의가 내부 상업-한일은행 출신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행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을 담당하겠다는 명목으로 외부인사가 올 수도 있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갖고 차기 행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중 차기 행장 후보를 추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누가 행장 후보로 오를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이 행장이 선임될 당시와는 달리 이번 차기 행장 선출 과정에서는 내부 분열의 봉합과 채용비리를 극복해야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은행이다. 그렇다보니 내부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한일-상업이 동수를 맞출 정도로 출신 은행별 견제와 파벌이 극심한 편이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장은 한일-상업 출신이 돌아가며 맡았지만 상업은행 출신인 이순우 전 행장에 이어 이 행장이 연이어 행장을 맡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 행장은 올 초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인사부터는 한일-상업 임원 동수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결국 양 파벌의 갈등이 내부의 채용비리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사회의 의지다. 또 다시 상업은행 출신 행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한일은행 출신 임원의 반발을 각오해야하고 그렇다고 한일은행 출신을 선임한다면 결국 출신 은행을 따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기 행장이 외부출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민영화된 우리은행에 정부발 낙하산이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임추위가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지분 18.52%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우리은행 안팎에 이와 관련한 소문은 무성하다. 사실상 2인자로 분류되던 남기명 국내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이 채용비리와 관련 직위해제 되면서 경우의 수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글로벌부문 겸 글로벌그룹 부문장이나 지난 1월 행장 선출 당시 최종 3인 후보로 남았던 김승규 전 우리금융 부사장, 이동건 전 우리은행 영업지원그룹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까지 이사회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사회는 내부 인사에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