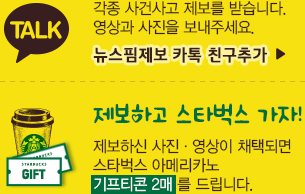[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아무개(83세) 어르신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 최근 기관지염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이 심해지자 촉탁의가 사전에 파악한 환자 특성을 토대로,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관찰했다. 촉탁의는 충분한 영양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잘 따른 어른신은 상태가 호전됐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노인요양시설의 사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에 참여한 어르신 가운데 88%가 만족했고, 9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 뿐만아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지역과 군부대 GP, 원양어선 등에서도 평균 80%이상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를 외친 집단이 있다. 주로 개원의들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오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신해철법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정책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국민 대부분이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사실상 국민의 의견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들 입장만 정답이라며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겠다며 협회 인사를 비례대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언제부턴가 국민보다는 특정 단체를 위한 자리가 돼 버렸다.
의협이 이처럼 자신하는 의학은 과연 허점이 없을까. 냉정히 말하면 지금의 의술은 향후 100년 후에는 사라질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 기초의학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역사를 따져봐도 그렇다. 의학의 기초가 된다는 생화학과 생리학, 병리학, 유전자학, 혈액학 등은 아직도 수정되고 있다. 한 예로 1900년대 초반만해도 의사들은 환자를 수혈을 할 때 혈액형도 구분하지 못했다. 혈액형이 3가지의 주요혈액형(A.B.O)이 있다는 것은 1901년, 1902년에 AB형이 발견됐다. Rh혈액형이 추가된 것은 1940년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밝혀졌다.
일명 유전자로 불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DNA도 1940년대 이르러서야 밝혀진 사실이다. 이전에는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1990년대 논란이 일었던 영화로 소개된 로렌조 오일 사례도 꺼내야겠다. 부신백질이영양증(ALD)에 걸린 로렌조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들은 유명하다는 대학병원들을 수소문해 다녔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상태만 악화될 뿐이었다. 지친 부모는 스스로 생리학과 생화학 등을 공부하면서 올레산과 에쿠르산을 섞은 오일이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이 오일을 먹은 아이는 만 2년밖에 못산다는 의사의 판단과 달리 20년을 더 넘게 살았다. 하지만 경험에 의한 치료로 아직 정식 치료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ALD환자 상당수가 의사 치료대신 이 오일을 섭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넬대에서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암제가 치료효과는 없고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란은 최근 일본에서도 한 의사가 "항암제가 특정 암에만 효과가 있고, 그외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고백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술만이 모두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선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격의료는 과학의 발전으로 불편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전에는 감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정책이다. 신해철법은 의사들의 권위에 막혀 의료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환자들이 투쟁해 얻어낸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굳이 꺼내지 않겠다. 다만 수백년간 한의원을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 한의학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며, 더 나은 진료 및 검증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다양한 리서치 결과에서 보듯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의협은 이익단체로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 및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이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면, 의협은 이에 대한 정책을 인정하고 앞으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 등 의사들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확인됐다면, 앞으로 이떠한 이익단체의 강경대응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