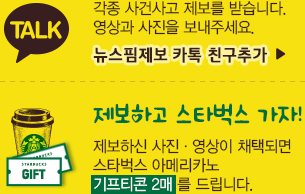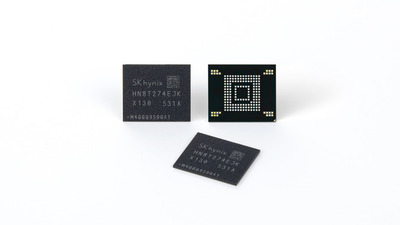지난 대선 기간 중 한 후보가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를 언급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교육활동소송 국가책임제'와 맥을 같이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이 바로 '교육활동소송 국가책임제'와 '교직원 민원 전담제'이다.

이 두 제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며,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민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책임자가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민원 당사자인 교직원이 민원 해결 전까지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오롯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자동차 보험'과도 같은 개념으로,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직접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매우 효과적이었다.
요즘 지인들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는 결코 녹록지 않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일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져 가는 교실의 책임을 선생님들에게만 전가할 수 있을까? 서이초 사건이나 제주도의 사례처럼,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자녀 사랑과 약화된 교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물론 선생님들 또한 "선생님은 교실에서 승부한다"는 말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정당한 권한, 즉 교권(敎權)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권이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 행사하는 정당한 권위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교사가 교사답게 설 수 있어야, 교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학생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는 '교육활동소송 국가책임제'와 '교직원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걱정 없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이제 교실을 선생님에게 돌려주자. 그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