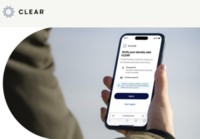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짝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전기차 충전해놓으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돼요. 야간에 몸 상하며 일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 초 아이오닉5를 신청해 운 좋게 곧바로 차를 받았다는 택시기사는 아직 뜯지 않은 차량 비닐을 가리키며 여유로운 일상을 늘어놨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를 모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근무를 견딜 유인이 줄어들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생활에 금방 적응했다. 심야 택시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했다.
비단 전기차를 모는 택시기사들만의 인식은 아니다. 유례 없이 고령화된 택시업계 전반의 분위기에 가깝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경우 부부 생활비 벌이면 충분하다. 서울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이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넓히면 75%, 택시기사 4명 중 3명에 달한다.
택시업계가 활력을 잃고 노령화한 이유는 저수익 구조 탓이다. 4인 가족 생계비를 벌려면 개인,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3~4인 가족의 생계비 수준인 월 300만원 이상 벌이가 가능하다는 게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다. 주·야간 2교대를 견뎌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너도나도 회사를 떠난다. 서울의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2015년 3만6700여명에서 지난해 2만3300여명으로 6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중 코로나 기간에 업계를 떠난 숫자가 1만명에 달한다.
경직된 택시요금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에 가깝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배달비를 시장에 맡기며 건당 1만원 넘게 받는 동안 서울의 택시요금은 4년 넘게 기본요금 3800원에 머물러 있다. 8km 주행요금 기준 우리나라의 2.2~3배에 달하는 런던, 파리, 뉴욕, 도쿄의 택시요금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낮다.
택시요금 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공요금 못지 않게 엄격하게 통제된다. 요금을 결정하는 지자체는 표 계산에 몰두하며 요금을 동결하기 일쑤다. 젊은 기사들이 배달시장으로 빠져나간 택시업계의 심야 택시난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플랫폼을 활용한 요금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점하고 있는 택시시장의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한계를 안고 있다. 요금체계 개편 없이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인 국토부가 또 다시 카카오를 밀어주는 형국이다. 전통 택시업계의 요금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플랫폼에는 시장논리를 부여하는 불균형 정책이 택시문제를 해결할 리 없다. 심야 택시난을 불러온 택시 고령화를 해소하려면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