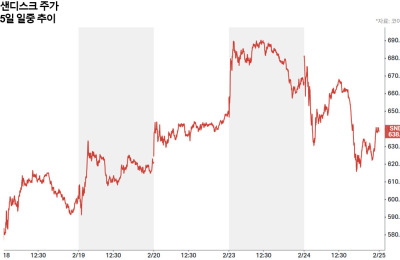일상에 흔히 보이는 것들로 뫼비우스적, 그 이상의 상상 여행을 하려 한다. 주변의 사물들엔 저마다 독특한 내력이 숨어 있고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보석이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출발한 여행의 과정에 어떤 빛깔의 풍경이 나타날지, 그 끝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필자 자신도 설레인다.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메타적 성찰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물과 풍경, 시대와 인문을 두루 관통하면서 색다르면서도 유익한 여행을 떠나려 한다.
제도의 맹점이니 무슨 무슨 맹점이니 하는 말들이 곧잘 쓰인다. 부정적인 뉘앙스이다. 그런데 우리 눈의 한 부위인 맹점이 과연 부정적인 것일까. 보기에 따라 그렇게도 보일 것이다. 보이는 것 위주의 눈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정반대의 방향을 취하니 말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자. 맹점이 없는 눈이 과연 존재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자연에 의해서건 신에 의해서건 진화에 의해서건 맹점 없는 눈이 탄생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눈 외의 다른 생명체들의 눈의 구조에 대해선 필자가 거의 아는 바 없지만 말이다.
 |
인간의 눈으로 한정해보건데 맹점은 어쩌면 눈에 필수 아닐까. 그것이 있어야만 눈이 가능하기에 그것의 존재는 필수이며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맹점은 긍정적인 것으로도 변모될 필요가 생긴다.
사실 맹점이라고 부르기 보단 맹면(盲面)이라고 불러야 합당할 것이다. 시각 기능이 없는 곳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실상과 유리되는 맹점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
한발짝 더 나간다면 맹점이든 맹면이든 그것이 본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주는 파악 불가능하다. 우리의 시각, 청각 등등 오감 너머에 존재한다. 뇌가 망가진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뇌의 감각 기능이 무너진 그녀에게 우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오감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괴이함으로 드러난다. 물론 그것 역시 뇌의 어떤 필터를 거쳤을 바 그 이전의 우주의 본연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맹점이야말로 우주의 본연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말을 바꿔 하면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풍경들은 그런 맹점 같은 우주의 일부를 극히 작위적으로 편집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크게는 문명 단위의 다채로운 것들은 그런 이미지 위에 기반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다른 것들 가령 파악 불가능한 본질마저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우주를 닮은 맹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뉘앙스도 이것과 관계있으며 원래는 맹면의 성격인 것을 맹점으로 축소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본연을 축소해야만 인간은 파악불가능한 본연의 괴이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처럼 뒤집혔으니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것인가.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본질에 위반되는 삶을 진짜로 알고 본질을 외면하면서 사는 삶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잔 말인가.
무슨 대안을 모색하는 글이 아니다. 그리고 대안들을 정한다는 것이 딱 옳은 것도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취약성과 존재적 아슬아슬함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상 우주의 본연에 이르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것에 우리의 삶과 문명을 투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러한 취약성과 존재적 아슬아슬함을 인정한다면 삶의 허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창(窓)이 순간순간 열릴 수 있다. 가령 앞에서 말한 제도적 맹점처럼 어떤 가치가 일방적으로 굳어지는 우를 벗어나 새로운 해석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
맹하다. 멍하다. 사각지대 등등. 이런 말들이 주변에 곧잘 쓰인다. 멍청한 자식. 어디에 눈을 뜨고 다니냐. 눈에 뵈질 않냐. 이런 류의 부정적인 말투들도 제법 흘러다니며 듣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물론 그런 말들이 맹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이해의 범주에 속한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그런 말들 모두는 그 발화자는 맹하지 않고 똑똑히 보며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살펴봤듯 그러한 태도는 착각이나 오류일 수 있다. 똑똑히 본다는 자체가 그럴 때의 눈이 맹점이 없으면 불가능한 바 맹점에 기반된 것이다. 맹점에 기반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맹점처럼 여긴다면 자가 당착이 된다. 또한 우주의 본연 자체가 맹점 같다고 한다면 똑똑한 척 하며 맹점인 듯 보이는 것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분석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자기 기준으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 사회에 넘치는 갑질이나 진영 논리의 논리적 구조를 파고들면 이에 당도될 것이다.
을이 갑질하는 경우도 생긴다. 을임에도 약자의 신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과잉의 보상을 받으려 하거나 과도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이다. 정당한 저항이나 환수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한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결여된 듯이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리하자면 맹점은 눈에서 필수인 바 그 가치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제도적 맹점이니 하는 경우에서처럼 사회적 맥락 속에 쓰이는 용례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범용성은 그대로 두더라도 맹점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숱한 것들 가령 상기한 맹함이니 멍함 등등의 가치를 그 본연으로서 밝힐 필요가 있다.
더욱이 스스로도 맹점에 기반된 바 맹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각이되 그에 대한 인지조차 없이 맹점인 듯 보이는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자가 당착이라는 사실이 확대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공감이 사회적으로 번져나가면 맹목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자신이 우스워지는 문화가 생성되어 우리의 사회 문화는 질적으로 고양될 길이 열릴 것이다.
이명훈(소설 ‘작약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