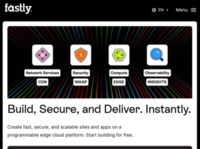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부활한다. 사라졌던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일부가 복구되는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조정했다. 폐지됐던 부과금을 도로 살려내고, 징수 규정까지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영화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를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로 해당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줄어드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은 일반 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올 초인 지난 2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폐지를 공지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의 부과금 정상 징수 계획만을 알렸다. 지난해 3월 정부에서 각종 부과금 폐지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 입법 예고를 한 지 6개월 만에 제도가 시행됐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실질적으로 티켓값 인하는 없었단 점이다. 정부는 당초 부담금 개편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관객들조차도 영화 티켓값의 3%가량인 부담금을 폐지해 과연 얼마나 티켓값을 내릴지 의아하다는 반응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극장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티켓값은 그대로였다. 개정안이 시행된 1월 1일부터 티켓값이 450원 정도 인하돼야 했지만, 주요 극장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영화 입장권 부담금 조정은 의도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정책이 됐다.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일부만 사라진 셈이었다.
결국 새로운 영비법 개정안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의 정책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 만에 철회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첫 발표부터 수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폐지'에만 방점이 찍힌 채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된 채 정책 시행 과정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단 비판이 나온다.
'부과금 부활' 촌극은 영화계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사업 재원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업계는 더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내건 좋은 취지의 정책도 업계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와 준비가 절실하다.
jyyang@newspim.com